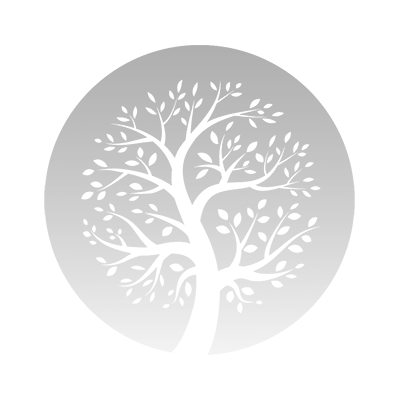Photography/Essay
2024. 10. 30.
부제 : 연향에 스러지다.

연꽃향 낭자하던 그 계절,
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벌써 북적 거렸다.
시흥의 대규모 연꽃단지인 이 곳은 매년 마다
연꽃이 필 때면 한번은 찾아가는 곳이다.
수 천년 간 사랑 받아 온 연꽃은
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의 깊이에
그저 바라 보기만 해도 좋다.
모든 꽃들이 다 이쁠진대,
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져
어느 바다 위로 다시 떠올랐을 때에도
타고 있었던 꽃도 연꽃이라던데
꽃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.
그런 연꽃 위에
벌이 누워 있었다.
자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,
툭 건드려도 미동 조차 않는다.
죽어 있었다.

아마도
어딘지도 모를 먼 거리의 집에서
요란한 동료의 몸짓을 읽어 내고,
동료가 알려 준 방향으로 날아 올라
꽃향기의 흔적을 열심히 따라가며
수 많은 천적들의 위협을 피해
연향 진동하는 천국에 도착하고선,
잠시 숨 돌릴 새도 없이
부산스레 이꽃 저꽃을 날아 다니며
꿀과 꽃가루를 모으던 중,
아직 벌어지지 않은 꽃잎 사이를
온 힘을 다해 기필코 비집고 들어 가
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
꿀샘에 목을 축이는데 정신이 팔려
해가 저물어 꽃을 빠져 나오려 했지만,
뚝 떨어진 기온에 더욱 움츠러든
꽃 속에 갇히고 말았고,
간밤의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에
결국엔 유명을 달리한 것이 아닐까?

꿀벌의 흔한 운명이다.
하지만, 향기로운 장소여서
죽음이 향기로울까?
살만큼 살아 낸 운명이니
호상이라 해도 될까?
어떤 죽음도 호상은 없다.
남은 이들에게 슬픔을 남겨두고 떠났는데..
'떠날 때를 알고 떠나가는 이의 뒷모습은
얼마나 아름다운가'를 외쳤던 누군가도
때를 알고 떠나갔을까?
자신이 떠나갈 때 웃을 수 있었을까?
어느 꿀벌의 죽음 앞에서
평생 사랑도 한번 못 해보고
일만 하다 과로사로 죽음을 맞이 한
꿀벌의 흔한 죽음은
수명을 다한 자연스러운 죽음이라지만
이 죽음은 그에게 호상일까?
살만큼 살았다고 해서
망자에게는 호상일 수 없다.
호상이란 그저
남은 자들끼리 슬픔을 달래는
자기 위로일 뿐이다.
ⓒ2023. Yeremiah K. Helios / 설마 / 박가이버
@beantree_parkgyver
'Photography > Essay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도깨비 (37) | 2024.11.28 |
|---|---|
| 보랏빛 추억, 깽깽이풀 (14) | 2024.11.17 |
| 산신령과의 인터뷰 (14) | 2024.11.11 |
| 길냥이의 충고 (9) | 2024.11.05 |